 유튜브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문의하기
문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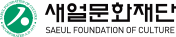
일본은 2010년 이후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라는 영광을 과거 자신들이 침략했던 중국에게 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1968년 이래 42년간 지켜온 미국 다음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치욕을 경험했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이에 일본은 미국의 힘을 빌려 과거 아시아의 패권을 다시 차지하고 싶은 야욕을 품게 되었고 동시에 미국은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중국을 견제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중국 해역의 크기는 한반도의 12배가 되고, 인접한 국가는 대만까지 포함하여 7개국이 됩니다. 이 광대한 해역에는 3000여 개의 섬, 바위, 산호, 모래톱, 썰물 때 나타나는 모래사장들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중동 산유국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90% 이상이 이 해역을 통과합니다. 남중국해의 가장 큰 2개의 섬, 남사군도(南沙群島)와 서사군도(西沙群島, 파라셀 군도)가 특별히 분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까닭도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과 베트남을 지원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 지역을 양보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풍부한 해저자원, 둘째, 전략적 지형 그리고 항행의 자유가 세 번째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직설적인 표현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중국해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지나친 정치적 압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열강들의 영토 분쟁에서 한쪽 편을 들 수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애치슨, 덜레스, 케넌 등이 쌓아올린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질서에 대한 중국의 정면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 계속 인공섬을 확장해가고 있으며 비행장, 항구시설, 어로전진기지, 어민생활터전까지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극도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우리 국익과 통일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중국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이며 11월 18일~19일에 열렸던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해 기조연설을 했던 자오치정(趙啓正, 1940~)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전략적 존재감을 유지하려면 북한과 같은 적(敵)이 필요하다. 미국은 대북억제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목적은 중국을 봉쇄·견제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핑계 삼으면서 중국에 대한 직접적 도발을 피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억제정책을 펴는 한편 접촉을 유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각축(角逐)이 벌어지는 한가운데 위치한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난하고 지루한 인내가 필요한 평화의 길을 중심축(中心軸)으로 삼아야 합니다. 멀리 구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독일 통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접해봤을 에곤 바르(Egon Bahr, 1922~2015)는 빌리 브란트 정부의 총리실 전략기획국장을 지내면서 독일 통일을 배후에서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데나워의 ‘선(先)통일-후(後)긴장완화’라는 정책을 ‘선긴장완화-후통일’로 뒤집었습니다. 바르는 오랫동안 설계해온 대로 유럽 전체의 긴장완화 안에서의 독일통일정책을 힘차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약 바르가 없었다면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미·영·불의 견제를 넘어 소련·동독과 협상하여 그는 1963년 12월 ‘베를린 통행증 협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동베를린 정부는 대략 3만 명 정도의 서베를린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때 동베를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무려 120만 명의 서베를린 시민들이 동베를린의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동베를린 정부가 예상한 3만 명의 40배나 되는 숫자였습니다.
바르는 우리나라 개성공단을 환상적인 정책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을 10여 년간 운영하면서도 지금까지 좀 더 뜻있게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한계를 드러낸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일을 항상 생각한다. 그러나 통일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나라 통일정책으로 풀어보면 남북한 모두 적화통일이나 흡수통일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우리 경제는 북한 경제의 43배 규모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흡수통일을 이야기한다면 북한은 비상식적인 핵개발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통일정책이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나쁜 정책이 될 수 있으며 남북대결을 지속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독일은 통일 정책이 아니라 평화공존정책의 결과로 통일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홍콩은 150년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서구화된 도시였습니다. 1997년 기나긴 식민 지배를 마감하고 중국으로 귀속되었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중국의 정체성은 찾기 힘듭니다. 중국은 비록 식민지를 돌려받기는 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자치구”라는 긴 이름으로 잠정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대만은 장제스(蔣介石, 1887~1975)와 대만 본토인의 원한이 양안(兩岸)에 깊게 서려있지만 적어도 서로 경제적 통일에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영국·대만과 협상을 전개할 때 중국이 내건 주장은 구동존이(求同存異)였습니다. 이것은 견해가 일치하는 것만 먼저 타협하고 서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유보하자는 전략인데, 덩샤오핑(鄧小平, 1904~1997)이 일찍이 “국권은 우리 손에 있다. 이견은 미루고 공동으로 개발하라”는 주장에서 연유됩니다. 우리도 통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보도, 선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미국을 비롯한 중·소·일의 동아시아 열강들이 우리를 다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끝으로 당나라 후기 산동성(山東省) 조주(趙州) 출신의 종심(從諗, 778~897)이라는 큰스님 이야기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조주 종심 스님은 120세까지 살면서 큰절의 방장도 마다하고, 암자 같은 관음원(觀音院)에 살았습니다.
“맨 흙바닥에 침대 하나와 갈대 잎으로 된 멍석 그 위에는 오래된 느릅나무 목침이 둥글고 이불 같은 깃은 보이지 않네(上榻牀 破蘆䉬 老楡木枕全無被)”
이것은 스님이 입적했을 당시 제자들의 탄식이자 청빈한 일상생활을 드러내는 경이로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떤 지방관리가 조주 종심 스님에게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큰 스님이라도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까?”
스님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아니 어째서 큰 스님께서 지옥 같은 데를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조주 종심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 어찌 그대를 만날 수 있겠는가?”
천지가 진동하는 법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 관리는 혼쭐이 나서 도망쳤을 겁니다. 선문(禪門)에는 ‘입지옥(入地獄) 타지옥(墮地獄)’이란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입지옥이란 자의로 지옥에 들어가 고통 받는 뭇 중생을 구한다는 뜻이지만, 타지옥은 자신의 업보로 지옥에 떨어지는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평소 시민이나 언론기관이 정당정치를 무참하게 비판하고 무력화시킨다면 결과적으로 행정과 사법을 견제해야 할 나라의 삼대 축 중 하나인 입법부가 무너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 시민의 손해이므로 시민의 대의기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근래에는 종종 생각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시민을 버리고 자기 지분 찾기에만 연연하여 정도(正道)를 짓밟고 최소한의 체면도 없이 싸우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지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을 위해 스스로 지옥행을 자처해야 할 지도자들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보이고 있으니 이것은 입지옥이 아니라 타지옥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외국 열강들의 세력다툼에 자청해서 뛰어들거나 통일을 말함에 있어 평화공존에 대한 방책 대신에 무력이나 상대방의 붕괴에 의한 갑작스러운 흡수통일이나 적화통일만을 생각하는 것 역시 우리 스스로의 업보로 지옥에 떨어지는 ‘타지옥’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2015년 12월 9일 수요일자 인천일보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