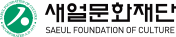전간기는 국제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던 혼란기이며, 소련 붕괴 후 30년이 지난 2020년대도 미국 패권이 약화하는 시기였다. 미국 중심의 패권 구조가 침식될 때마다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도래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으로 우리가 익숙했던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객관적 국력이 약해져서 세계 질서가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능력이 있음에도 손을 놔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친기업·신자유주의적이던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백인민족주의 성향을 보이는 등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미국 사회 자체가 내향적인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3개 강대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다. 이들이 어떻게 안정적인 세력 균형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며 “이전까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압도적인 패권 국가로 존재하고, 미국이 구축한 세계 질서 안에서 어떻게 국익을 최대화할 것인지가 한국 외교의 기본 전제였다. 이제는 그 전제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국제 질서가 변화하는 시기, 차 교수는 한국도 현실주의적 외교 전략을 고민할 시기라고 봤다.
“이러한 상황에도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려는 것은 이념을 떠나 한국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당연한 논리”라며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남북통일과 북한 비핵화 등의 비전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20~30년 간은 현실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병존한다고 보고, 남북 또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유튜브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문의하기
문의하기